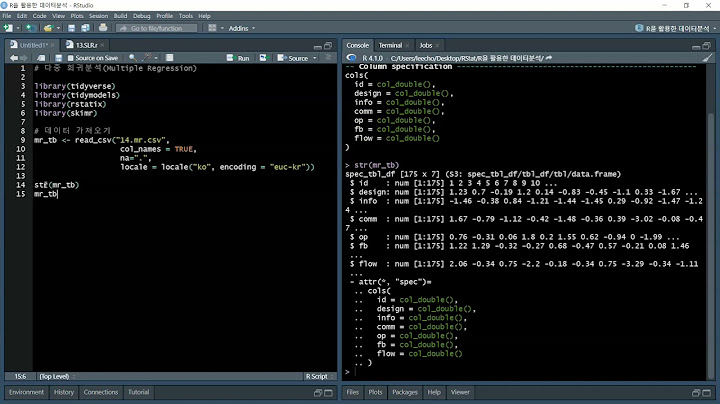*햐암: 향암(鄕闇). 시골에서 지내 온갖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음. 또는 그런 사람. *부럴: 부러워할. *삼공: 삼 정승.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이름. *만승: 만 개의 수레를 부리는 천자(天子). *소부 허유: 요임금 때 세상을 등지고 살던 인물들. 허유는 요임금이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하자 받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귀가 더러워졌다고 영수(潁水)에 귀를 씻고 기산(箕山)에 숨었다고 하고, 소부는 그 물을 소에게 먹일 수 없다고 했음. 중국 고대의 은사(隱士)들임. *임천 한흥: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한 흥취. *만흥: 저절로 일어나는 흥취. ▣ 해제 자연과 더불어 유유자적하며 살아가는 흥겨운 삶을 노래하고 있는 전체 6수의 연시조이다. 이 작품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소박하고도 한가로운 생활을 하면서 만족감과 흥취를 느끼고 있다. 자연에서 지내는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면서도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해 준 임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작품 풀이 <제1수> 산수간(山水間)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산수'와 더불어 생활하고자 하는 화자의 바람 *띠집: 띠풀로 지은 집. 움막, 초가집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그 모른 남들'-혼탁한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연을 지향하려 한 화자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어리고 햐암의 뜻에는 내 분(分)인가 하노라 *화자는 자연에서의 삶이 자신만이 누릴 수 있는 삶이라고 여김. *분(分): 분수. 자기 신분에 맞는 한도 *햐암-겉으로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표현이지만 그 이면에는 세속의 일을 모르고 사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 있음. 산수 사이 바위 아래 초가집을 짓는다고 하니 그것(화자의 생각)을 모르는 사람들은 비웃는다고 한다마는 어리석고 시골뜨기(화자)의 뜻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분수인가 하노라 ▶ 안분지족(安分知足)의 삶 <제2수>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띠집'에 거처하는 화자의 검소한 삶의 모습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노니노라 *'산수간'에서 생활하면서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화자의 모습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럴 줄이 있으랴 *여남은: 열이 조금 넘는 수. 또는 그런 수의 *그 남은 여남은 일-세속의 일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며 세속적 욕망을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노니노라 그 밖에 남은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있겠느냐 ▶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삶 <제3수>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뫼를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자연 속에서의 생활에 대한 만족감 → '님'을 언급한 것은 만족감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지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 아님. 말씀도 웃음도 아녀도 못내 좋아하노라 *산과 하나가 되어 혼연일체(渾然一體)의 경지에 오른 화자의 모습 잔 들고 혼자 앉자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워하던 임이 온다고 한들 반가움이 이만할까 (그 산이) 말씀도 웃음도 아니하여도 못내 좋아하노라. ▶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 <제4수> 누고셔 삼공(三公)보다 낫다 하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하랴 *삼공, 만승-세속에서의 삶(높은 지위)을 의미함 *세속적 가치와 비교하여 자연에서 지내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냄. 이제로 헤어든 소부 허유(巢父許由)가 약았더라 *'산수간'에서의 생활을 만족스럽게 여기는 화자의 마음 아마도 임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없어라 누구인가, (자연이) 삼공보다 낫다고 하던 사람이. 만승(천자의 자리)이 이만하겠는가 지금 생각해 보니 소부 허유가 영리했구나 아마도 자연에서 느끼는 한가로움을 비길 곳이 없도다 ▶ 자연과 벗하며 사는 삶에 대한 자부심 <제5수>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으실사 인간 만사(人間萬事)를 한 일도 아니 맡겨 *인간 만사, 한 일-세속에서의 삶을 의미함 다만당 다툴 이 없는 강산(江山)을 지키라 하시도다 *정치적 갈등으로 번잡한 현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연 지향 의식을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 줌. 내 천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아시어 인간 만사의 일 가운데 하나도 아니 맡겨 다만 다툴 사람 없는 강산을 지키라고 하셨도다 ▶ 자신의 천성에 맞는 자연에서의 삶 <제6수>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分)으로 누었느냐 *화자는 자연에서의 삶이 임금의 은혜 덕분에 주어진 것이라고 여김.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하올 일이 없어라 *자연에서의 삶을 살도록 해 준 임금의 은혜를 갚고자 하지만 임금을 위해 ‘하올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 → 자연에서의 삶에 만족하면서도 정치 현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것 강산이 좋다고 한들 내 분수로 누웠겠느냐 임금의 은혜를 이제 더욱 알게 되었도다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 표현상 특징 - 대조를 통해 화자의 처지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냄. - 고사의 인물을 인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드러냄. -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여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냄. → ‘그 나믄 녀나믄 일이야 부럴 줄이 이시랴’, ‘누고셔 삼공도곤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와 같은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여 자연에서 지내는 삶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음. ▣ 주제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과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 더 읽을 거리 「만흥」은 윤선도가 해남의 금쇄동(金鎖洞)에서 기거하며 지은 노래이다. 윤선도는 정치 현실에서 잇따른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번잡한 현실에 대한 번뇌를 씻고자 자연 지향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자연에서 은둔하는 삶에 대해 “경국제민(經國濟民)은 일찍부터 숭상한 바요, 세상을 등지고 은둔함은 본래 기약한 뜻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며 “은거할 때에는 마땅히 세상 잊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만흥」에는 자연 지향 의식과 함께 정치 현실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못하는 경세 지향 의식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

관련 게시물
광고하는
최근 소식
광고하는
포퓰러
광고하는

저작권 © 2024 ko.apacode Inc.